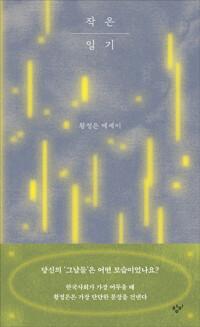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에세이 > 한국에세이
· ISBN : 9791165398804
· 쪽수 : 364쪽
· 출판일 : 2021-07-19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하나, 멀리 가듯 나섰지만
멀리 가듯 나섰지만, 죽성 포구 두모포
거울과 겨울, 양주 어둔리 저수지
파랑새 나무, 월출산 무위사
삼포 길 착각, 고창 곰소만 상포만
깜짝 눈 두어 번, 고창 선운사
철쭉이 지나간 자리, 기장 철마산
산죽 같은 삶, 무주 덕유산 향적봉
어느 섬이라도 그렇듯, 홍도와 흑산도
등대의 그늘과 빙빙 국수, 가고시마 당선협
당항포 희망, 고성 당항만
봉분과 시간, 거창 삼봉산 내당마을
떠나면서 돌아보니 멀고 먼 고향, 사천 철봉골 화전마을
둘, 배낭을 벗으니
어, 누구?
호텔 방 확대경
우리들의 30년
사진 속의 그 사진 밖의 나
감꽃 사이 연기
박상꽃 와이셔츠
배낭을 벗으니
어제 먹은 점심
공터 아주까리
까마중 먹땡깔
빈 들
셋, 와룡산 수채화
달리아 그거 내겐 따리아
외또리 양철집
황토 마당 포구 총
타작마당 기양 감나무
토끼풀과 아일랜드
지게 자리 그곳, 이제는 아련한 영마루
와룡산, 블루 수채화
금오산, 동경 담채화
지리산 천왕봉, 성장 백색화
두량 못 삘기
그 섬 신수도
넷, 두 개의 바위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오랜만에 참 오랜만에
우산
두 개의 바위틈
책, 읽기와 읽지 않기
한 사실 두 해석
한국인이라면 그 집 정원에
요롱과 워낭
유행과 미련
시장과 철학
조율 한
다섯, 바위와 새집
작업화, 긴 세월을 내 발과 함께 한
내려친 벼락
감자
모자
출문과 입문
다시 본 고무망치
녹음 놀이와 인생
바위와 새집
공상과 실행
물망초
반전
여섯, 광포만 쪽빛 언덕
광포만 쪽빛 언덕
영복 마을 그 내력이 무엇이길래
파도 바람 구름 철길 친구
금암요 회상
와룡산 하늘 포구
경매장 여기저기
냄새 없는 세상
존재의 가루
버리는 곳 꽃섬
내가 노는 바다
일곱, 다시 올 봄의 화사한 첫차
간장독 하늘
비오델 이게 뭐람
그때 봉숭아 물 손톱
타인의 북 나의 북
오요요 강아지풀
격자창 가을 사랑
옛 집터 찔레
로켓 라디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다시 올 봄의 화사한 첫차
책꼬리에
저자소개
책속에서
거울과 겨울은 이름이 비슷하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닮은 데도 있다. 거울을 통해서 겨울을 볼 수 있고 겨울은 또 계절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걷고 있는 커브 길 모퉁이의 도로 반사경이라는 볼록 거울 속에는 겨울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울 속의 길로 겨울이 오고 있었다. 11월 초순인데도 거울 뒤의 논에는 살포시 언 얼음이 깔려 있었다.
여름의 숲은 자기 속을 감춘다. 그러다가 늦가을부터 숲은 자기 속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외진 산자락의 감나무에 떨어질 듯 매달려 있는 감들은 눈을 맞다가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까치나 청설모의 밥이 되기도 한다. 계절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둬들인 후 겨울이면 이 모든 것을 다 놓아 버린다.
겨울은 또한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쫓기듯 허둥지둥 사는 건 이른바 ‘존재적 삶’이 아닌 ‘소유적 삶’이라는 걸 겨울은 잎들을 다 떨구고 서 있는 나목들을 반면교사로 내게 보여 준다. 겨울은 내게 말한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말라고, 이제 좀 그만 움직이고 안으로 향하라고, 안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라고, 다른 것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제일 큰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이다
_ 거울과 겨울, 양주 어둔리 저수지
“저게 뭐더라? 저거 이름이 뭐더라?” 저것들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랄 때 저것을 ‘쌀밥’ 또는 ‘소 쌀밥’이라 불렀다. 소 쌀밥 저것의 정확한 이름이 쇠뜨기인 것을 확인한 것은 집에 돌아와서였다. 고상(高上)으로 담은 밥그룻 형상의 붕분을 먼 발치에서 둘러싸고 있는 쌀밥 쇠뜨기들….
밥그릇, 모든 밥에는 임자가 있다. 무덤에는, 말하자면 모든 죽음에는 또한 확실히 임자가 있다.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너의 죽음이지 우리의 죽음은 아니다는 뜻이다. 죽음의 자리는 누구로부터도 침범당할 수 없는 나의 자리이고 너의 자리이며 그래서 확실한 자리이다.
두충나무 숲에는 밥을 먹어야 가는 시간이 있었고 고봉으로 담은 쌀밥 그릇의 무덤 밭 둘레에는 쌀밥이라고 불렀던 쇠뜨기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_ 봉분과 시간, 거창 삼봉산 내당마을
그때 우리 집 한구석 꽃밭엔 키다리 물국화가 많았다. 그 옆엔 따리아 그리고 가을 국화와 다른 꽃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당 앞에 꽃밭이, 정원이 아니라 꽃밭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다. 누구의 노력으로 그 꽃밭이 만들어졌는지 기억에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 누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나 동생들은 물론 아니다. 아니면 진주에서 시골 그 외진 집으로 이사 내려왔을 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돌볼 손이 없었으니 그 속의 화초들이 자기들 나냥대로 즉 마음대로 이리저리 서 있었지만, 화초의 가지 수는 많았다. 봄부터 무서리 늦가을까지 내내 꽃들이 있었다. 그중에 키다리 물국화와 따리아, 하나는 촌스러운 분위기고 다른 하나는 도회지다운 분위기여서 이질적이었지만 이 둘은 같이 붙어 있었다. 당국화라 부르는 과꽃과 맨드라미 그리고 나팔꽃도 또 무성했고.
_ 달리아 그거 내겐 따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