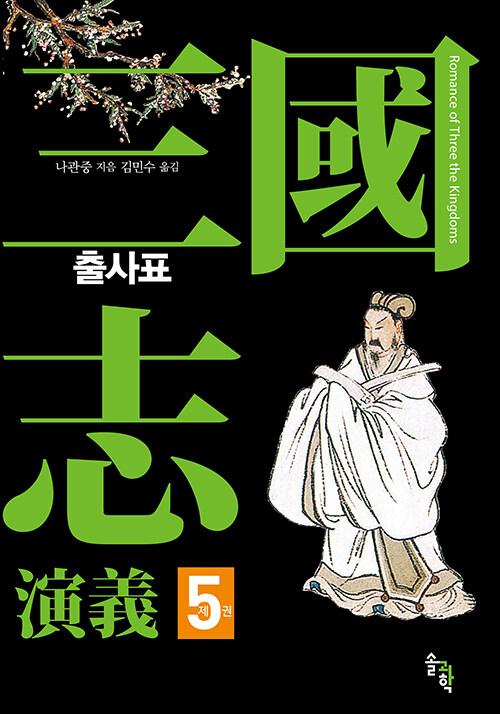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중국소설
· ISBN : 9791192404769
· 쪽수 : 508쪽
· 출판일 : 2024-05-08
책 소개
목차
서문 • 4
제Ⅰ편 도원결의 •19
서사序詞 • 20
관우와 장비의 첫 번째 전공戰功 • 24
유비의 첫 번째 전공 • 26
동탁을 죽이려는 장비 • 28
무모한 하진의 최후 • 30
여포의 적토마 • 32
황제 폐위에 목숨으로 저항한 정관 • 34
쌍비연가双飛燕歌 • 36
죽음을 앞둔 황제의 노래 • 38
당비의 노래 • 39
오부伍孚를 기리는 시 • 42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을 죽인 관우 • 44
여포와 겨룬 세 영웅 • 46
떠도는 동요를 믿고 천도하는 동탁 • 52
춤추는 초선 Ⅰ • 54
춤추는 초선 Ⅱ • 55
노래 부르는 초선 • 58
초선의 연환계 • 60
동탁의 죽음을 예견하는 동요 • 62
동탁의 최후 • 64
동탁의 죽음을 애도하다 죽임을 당한 채옹 • 66
왕윤의 최후 • 68
조조 부친의 죽음 • 70
이각·곽사의 난 • 72
황량한 낙양의 모습 • 76
여포의 활솜씨 • 78
조조의 용병술 • 80
진궁을 죽인 조조 • 82
여포의 최후 • 84
여포를 죽이라고 하는 유비 • 85
제Ⅱ편 삼고초려 •89
유비의 임기응변 • 90
조조의 손아귀를 벗어난 유비 • 92
원술의 최후 • 94
예형의 죽음 • 96
태의太醫 길평의 죽음 • 98
국구國舅 동승의 죽음 • 100
왕자복 등 네 사람의 죽음 • 101
동 귀비의 죽음 • 104
조조에게 패한 유비 • 106
항복하지 않은 관우 • 108
다섯 관문 지나며 여섯 장수를 벤 관우 • 110
유비 형제들의 재회 • 112
세 가객의 의로운 죽음 • 114
손책의 죽음 • 116
허유의 계책을 듣지 않은 원소 • 118
충신 저수의 한탄 • 120
충렬저군지묘忠烈沮君之墓 • 122
전풍의 죽음 • 124
원소의 최후 • 126
충신 심배의 죽음 • 128
곽가의 죽음 • 130
유비의 실언 • 132
유비를 없애려는 채모의 모략 • 134
적로마로 단계를 뛰어넘은 유비 • 136
형양의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 140
유비를 찾아간 선복 • 142
제갈량을 유비에게 천거한 선복 • 144
서서의 모친을 찬양한 시 • 146
와룡선생이 지은 노래 • 148
와룡강의 경치 • 150
강태공과 역이기를 찬미하는 석광원 • 154
은둔자를 찬미하는 맹공위 • 158
공명의 아우 제갈균의 노래 • 162
와룡의 장인이 부른 양부음梁父吟 • 164
유비의 두 번째 방문을 노래한 시 • 166
제갈량이 잠에서 깨어나 읊은 시 • 168
삼고초려 끝에 얻은 제갈량 • 170
유비의 책사가 된 제갈량 • 172
초려를 떠나 세상에 나온 제갈량 • 173
서씨 부인의 재치 • 178
제갈량의 첫 번째 승리 • 180
공융의 죽음 • 182
유표의 죽음 • 184
공명의 두 번째 전공 • 186
제Ⅲ편 적벽대전 •189
유비의 어진 마음 • 190
여장부 미부인의 죽음 • 192
아두를 구한 조운Ⅰ • 194
아두를 구한 조운Ⅱ • 196
구해 온 자식에 대한 유비의 반응 • 198
혼자서 백만 대군을 물리친 장비 • 200
동작대부銅雀臺賦 • 202
주유가 칼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 • 210
주유의 계책에 걸린 조조 • 212
대무수강부大霧垂江賦: 강에 드리운 짙은 안개 • 214
제갈량이 얻은 십만 개의 화살 • 224
방통의 연환계 • 226
방통이 서서에게 알려준 계책 • 228
미리 승리감에 도취된 조조 • 230
조조의 단가행短歌行 • 232
칠성단에서 동남풍을 비는 제갈량 • 236
적벽대전Ⅰ • 238
적벽대전Ⅱ • 239
조조를 살려 보낸 관우 • 242
황충을 얻은 유비 • 244
태사자의 죽음 • 246
한석恨石 • 248
천하제일강산天下第一江山 • 250
주마파(駐馬坡: 말이 멈춘 언덕) • 252
마음이 흔들리는 유비 • 254
조조에게 신하로 남으라는 충언 • 256
뛰는 주유 위에 나는 제갈량 • 258
화병으로 죽은 주유 • 260
주유를 조문하는 제갈량 • 262
마등의 죽음 • 264
묘택과 이춘향의 죽음 • 266
수염을 자르고 달아난 조조 • 268
천하의 기재奇才 장송 • 270
왕루의 절개 • 272
제Ⅳ편 삼분천하 •275
작은 주인을 지킨 조운 • 276
작은 주인을 구한 장비 • 277
순욱의 죽음 • 280
장송의 허망한 죽음 • 282
자허상인의 여덟 구 • 284
방통의 죽음 • 286
방통의 죽음을 예견한 동요 • 287
엄안의 기개 • 290
엄안을 항복시킨 장비 • 291
장임의 절개 • 294
관우의 기개 • 296
비루한 화흠의 인간성 • 298
청백한 관영의 됨됨이 • 298
조조의 잔인한 행동 • 300
양송의 최후 • 302
위기를 벗어난 손권 • 304
감녕의 활약 • 306
최염의 죽음 • 308
조조를 깨우치려던 좌자 • 310
관로의 신통력Ⅰ • 312
관로의 신통력Ⅱ • 314
경기耿紀와 위황韋晃의 충정 • 316
황충의 활약 • 318
몸 전체가 간덩이인 조운 • 320
재주를 잘못 부린 양수 • 322
방덕을 사로잡은 관우 • 324
신의神醫 화타와 천신天神 관우 • 326
관우의 죽음Ⅰ • 328
관우의 죽음Ⅱ • 329
옥천산 사당에 붙은 시 • 332
화타의 죽음과 불타버린 청낭서 • 334
사마사의 등장 • 336
업중가鄴中歌: 조조의 죽음 • 338
우금의 죽음 • 344
조식의 칠보시七步詩Ⅰ • 346
즉시 지은 시(시제: 형제), 칠보시Ⅱ • 348
옥새를 지키다 끝내 목숨을 잃은 조필祖弼 • 350
황제 자리를 찬탈한 조비 • 352
제Ⅴ편 출사표 •355
장비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 356
황충의 죽음 • 358
감녕의 죽음 • 360
육손의 재주 • 362
7백 리 영채 불사른 육손 • 364
부동의 장렬한 죽음 • 366
자결로 충성 바친 정기 • 368
장남張南과 풍습馮習의 죽음 • 370
헛소문에 목숨을 버린 손 부인 • 372
제갈량의 팔진도八陳圖 • 374
황권의 배신 • 376
촉주蜀主 유비의 죽음 • 378
노수瀘水 • 380
남방의 무더운 날씨Ⅰ, Ⅱ • 382
맹획의 형 맹절 • 384
경공배정耿恭拜井 • 386
칠종칠금七縱七擒 • 388
노익장을 과시하는 조운 • 390
왕랑을 꾸짖어 죽인 제갈량 • 392
거문고로 사마의의 대군을 물리친 제갈량 • 394
읍참마속泣斬馬謖 • 396
조운의 죽음 • 398
계책으로 왕쌍을 죽인 제갈량 • 400
장포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제갈량 • 402
제Ⅵ편 천하통일 • 405
제갈량의 계책에 걸린 장합 • 406
병으로 죽은 관흥 • 408
유마流馬와 목우木牛 • 410
하늘이 구해 준 사마의 • 412
제갈량의 죽음을 애도하는 두보의 시 • 414
제갈량의 죽음을 애도하는 백거이의 시 • 415
당나라 시인 원미지의 제갈량을 찬양한 시 • 416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달아나게 함 • 418
위연의 운명을 예견한 제갈량 • 420
제갈량을 찬탄한 두보의 시Ⅰ • 422
하휴령의 딸의 절개 • 426
신헌영의 판단력 • 428
관로의 예지력 • 430
오주吳主 손권의 죽음 • 432
위기에 처한 사마소 • 434
목 졸라 죽임 당한 장 황후 • 436
황제의 자리를 빼앗긴 조방 • 438
젊은 문앙의 활약 • 440
의리의 전사 우전의 최후 • 442
제갈탄의 휘하 군사들의 충의 • 444
강제로 폐위당한 오주 손량 • 446
자신의 명을 재촉한 조모의 잠룡潛龍 시 • 448
토사구팽이 되고 만 성제 • 450
왕경王經 모자의 절개 • 452
하후패의 최후 • 454
충신 부첨의 의로운 죽음 • 456
정군산에 신령으로 나타난 제갈량 • 458
제갈량의 예지력에 탄복한 등애 • 460
마막의 부인 이씨의 죽음 • 462
제갈첨 부자의 장렬한 전사 • 464
북지왕北地王 유심의 자결 • 466
마침내 항복하는 후주 • 468
한의 멸망과 제갈량을 추념하는 시 • 470
등애의 최후 • 472
종회의 죽음을 탄식한 시 • 473
강유의 죽음을 탄식한 시 • 474
어리석은 후주 • 476
주먹 하나로 가로막을 수 없는 태산 • 478
위나라의 멸망 • 480
양호의 타루비墮淚碑 • 482
최후까지 저항하다 장렬하게 전사한 장제 • 484
오주 손호의 항복 • 486
결국 진으로 통일이 된 위·촉·오 삼국 • 488
후기 관제시죽의 올바른 이해 • 496
저자소개
책속에서
서사序詞
곤곤장강동서수
滾滾長江東逝水
랑화도진영웅
浪花淘盡英雄
시비성패전두공
是非成敗轉頭空
청산의구재
靑山依舊在
기도석양홍
幾度夕陽紅
백발어초강저상
白髮漁樵江渚上
관간추월춘풍
慣看秋月春風
일호탁주희상봉
一壺濁酒喜相逢
고금다소사도부소담중
古今多少事都付笑談中
세차게 흐르는 장강 물 동으로 흐르고
물 위의 포말처럼 영웅들 스러져 갔네
옳고 그름 성공 실패 돌아보니 헛되네
푸른 산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인데
그동안 저녁노을 몇 번 정도 붉었을까
강가의 고기잡이꾼과 백발의 나무꾼은
가을 달 봄바람을 감상하길 좋아하네
한 단지 탁주에 서로 만남을 기뻐하며
고금의 여러 일들 흥에 겨워 얘기하네
--------------------------------------------
*滾滾(곤곤): 강물이 세차게 굽이쳐 흐르는 모양.
*漁樵(어초): 어부와 나무꾼. 여기서는 은둔자를 상징.
*秋月春風(추월춘풍): 가을 달과 봄바람. 흘러가는 세월을 이르는 말로 백거이(白居易)의 대표적 서사시인 비파행(琵琶行)에 나옴.
--------------------------------------------
삼국지연의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사詞이다.
원문에는 詞曰: 로 시작한다.
사는 시와는 다른 노랫말, 즉 가사로 중국 송宋나라 때에 유행했던 문학 장르이다.
이 서사는 나관중본에는 등장하지 않고 모종강본(청나라 초기)에 처음 나타났으며 오랫동안 누구의 작품인지 알려지지 않다가 1990년대에 비로소 명明나라 문인 양신楊愼이 지은 ‘임강선臨江仙’이라는 사詞의 일부분으로 밝혀졌다.
양신은 20대에 과거에 급제해 출세가도를 달리던 중 30대에 황제의 비위에 거슬려 변경으로 쫓겨나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학문에 전념했다.
그는 중국의 역사를 10단계로 나누어 ‘이십일사탄사二十一史彈詞’라는 노래를 지었으며 이 부분은 그 중 3단계인 진秦과 한漢나라의 노래 부분이다.
14세기 말 나관중이 필사본으로 쓴 삼국지연의는 3백여 년 동안 수십 종의 필사본과 인쇄본 등 판본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에 나온 모종강본은 이후 모든 판본을 압도하여현재까지 어떠한 판본도 나오지 않고 있다.
모종강 부자가 수십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평역한 삼국지연의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글귀로 바로 이 서사를 선택한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유비
오촉성혼차수심
吳蜀成婚此水潯
명주보장옥황금
明珠步幛屋黃金
수지일녀경천하
誰知一女輕天下
욕이유랑정치심
慾易劉郞鼎峙心
오와 촉은 이곳 물가에서 성혼하고서
구슬과 황금으로 장막과 집을 꾸몄네
뉘 알았으랴 여인이 천하보다 중하여
삼분천하 유비의 마음 흔들릴 줄이야
--------------------------------------------
*水潯(수심): 물가.
*步幛(보장): 비바람을 가리는 장막.
*劉郞(유랑): 유비.
*鼎峙(정치): 세 세력이 대립하다
--------------------------------------------
주유는 유비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계책이 거꾸로 뒤집히자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계책을 꾸민다.
유비에게 궁궐 같은 큰 집을 마련해 주고 미녀와 금은비단 등을 주어 오래 살게 함으로써 저절로 공명·관우·장비 등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하여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주유의 예상대로 유비는 가무와 여색에 빠져 형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연말이 되자 조운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갈량이 준,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 보았다. 그리고 유비에게 말한다.
“오늘 아침 공명이 사람을 보내왔는데, 조조가 정예병 5십만 명을 거느리고 형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비는 손 부인에게 형주로 돌아가고 싶다고 사실대로 말하자, 손 부인은 새해 첫날 모친께 세배 드릴 때, 강북을 바라보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대로 떠나자고 했다.
유비와 자신의 누이가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안 손권은 부하들에게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라도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몇 번의 목숨을 잃을 위기를 손 부인의 기지로 간신히 벗어난 유비가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는데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유비가 한참 생각에 잠겨있는데 조운이 말한다.
“주공께서는 그 위험했던 범의 아가리 속에서도 벗어나 이제 우리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제갈 군사께서 틀림없이 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유비는 문득 동오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즐기던 일들이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처량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후세 사람이 이 일을 두고 탄식하며 지은 시이다.
제갈량을 찬탄한 두보의 시 Ⅰ
승상사당하처심
丞相祠堂何處尋
금관성외백삼삼
錦官城外栢森森
영계벽초자춘색
映階碧草自春色
격엽황리공호음
隔葉黃鸝空好音
삼고빈번천하계
三顧頻煩天下計
양조개제노신심
兩朝開濟老臣心
출사미첩신선사
出師未捷身先死
장사영웅루만금
長使英雄淚滿襟
승상의 사당을 어디 가서 찾으리오
금관성 밖 잣나무가 울창한 숲이라
섬돌에 비친 풀빛은 봄기운이 일고
잎새 사이 꾀꼬리소리 마냥 곱구나
세 번 찾아 천하 계책 거듭 물으니
두 대 걸쳐 늙은 신하 마음 바쳤네
출병해 이기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들의 옷깃 눈물로 적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