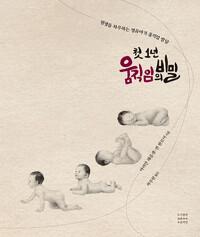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철학
· ISBN : 9788968498954
· 쪽수 : 350쪽
· 출판일 : 2022-06-25
책 소개
목차
근대호남유학연구 총서를 내면서 / 004
해제 / 006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강학 활동과 노사학파(蘆沙學派)의 확대|박학래 / 23
들어가는 말 / 23
지속적인 강학 활동과 直傳 제자의 배출 / 27
■ 독서종자(讀書種子) 양성을 위한 강학 활동의 전개 / 27
■ 자유로운 강학 분위기와 학파 결집 주도 / 37
기정진의 직전 제자 중 최대 문인의 배출 / 44
직전 제자의 학문 활동과 노사학의 계승 / 50
■ 『송사집』의 간행을 비롯한 현양 사업의 전개 / 50
■ 노사학의 계승과 다양한 학문 활동의 전개 / 54
■ 의병 및 항일운동으로 이어진 실천 지향적 면모 / 63
맺음말 / 68
기우승(奇宇承)의 「외필문목(猥筆問目)」 비판|이향준 / 71
-「박외필문목변(駁猥筆問目辨)」을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 71
기우승의 생애와 사승 / 74
「독기노사외필」 1・2의 등장 / 81
「독기노사외필」 1・2의 서술 구조 / 86
한유와 하우식의 「외필」 비판 / 89
「외필문목」의 재구성 / 97
기우승의 「외필문목」 비판 1 / 100
기우승의 「외필문목」 비판 2 / 106
나가면서 / 111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조우진 / 113
들어가면서 / 113
안빈낙도(安貧樂道)와 은일(隱逸) / 116
가정교육의 지침 / 122
■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約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 / 122
■ 「지신도설(持身圖說)」 / 128
■ 「완심도설(玩心圖說)」 / 133
나가면서 / 139
노사(蘆沙)와 화서(華西)의 만남|이향준 / 142
-박해량(朴海量)의 「해상일기(海上日記)」를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 142
생애와 사승 / 145
해상일기: 1차 여행 / 149
해상일기: 2차 여행 / 155
해상일기: 3차 여행 / 160
명덕설 토론 1: 최익현과 박해량을 중심으로 / 163
명덕설 토론 2: 박해량과 기정진을 중심으로 / 168
나가면서 / 175
소백(小栢) 안달삼(安達三)의 교유와 그 의미|김새미오 / 178
들어가며 / 178
소백 안달삼의 삶과 『소백처사유고』 / 180
소백 안달삼과 노사 기정진 / 190
소백 안달삼과 면암 최익현 / 200
결론을 대신하며 / 205
난와(難窩) 오계수(吳繼洙)의 성리설과 실천적 의리정신|조우진 / 207
들어가면서 / 207
선난후획(先難後獲)의 삶 / 210
성리설에 대한 재구성 / 215
■ 이기설(理氣說) / 215
■ 심성론(心性情) / 221
실천적 의리정신 / 226
■ 인의(仁義)의 실천원리 / 226
■ 불의에 저항하는 의리정신 / 231
나가면서 / 235
「외필(猥筆)」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서|양순자 / 238
-기정진(奇正鎭)과 조성가(趙性家)의 문답을 중심으로-
서론 / 238
태극과 동정 / 242
천명(天命)의 유행 / 250
소승지기(所乘之機) / 258
결론 / 267
순창지역의 노사학파(蘆沙學派) 문인 조사와 계승성 고찰|이형성 / 271
들어가는 말 / 271
순창의 유학 전래와 전승 / 275
순창지역 노사학파 전승 문인 조사와 활동 / 280
순창의 무양서원과 노사학 계승 / 293
맺는 말 / 299
저자소개
책속에서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강학 활동과 노사학파(蘆沙學派)의 확대*
박학래(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
들어가는 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眞, 1798~1879)으로부터 연원하는 노사학파(蘆沙學派)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를 관통하며 근현대 호남 유학의 중심을 이룬 문인집단이었다. 근대 이행기를 거치면서 유학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하는 가운데 호남을 넘어 서부 경남지역에까지 다수의 문인을 배출하며 그 학파적 외연을 확대한 노사학파의 문인들은 기정진 생전에 이미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하며 실천 지향적 면모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정진 사후에 펼쳐진 의병 활동과 항일운동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의리 실천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현실화하였다. 또한 이들은 20세기 초반에 불거진 기정진의 성리설과 관련한 기호학계의 논쟁 과정에서 타 학파 학자들의 비판에 맞서 반비판을 전개하며 노사학에 대한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부각하는 한편, 다른 학파에서 드러나는 분열적 면모와는 달리 학문적 일체성을 유지하며 학파 내부의 결집을 도모하였다. 이에 더하여 노사학파 문인들은 유교 문화에 대한 수호 및 계승 의식을 뚜렷이 하며 호남과 서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유교 문화의 부식과 유교 정신의 확산에 앞장섰다.
근 1백여 년간 지속된 노사학파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직전(直傳) 제자 중 한 사람은 기정진의 손자이자 대표 문인으로 평가받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었다. 기정진 사후에 문인 내부에서 노사학파의 적전(嫡傳)으로 인정받았던 그는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여 호남 유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세 번에 걸쳐 진행된 『노사집(蘆沙集)』과 두 차례의 『답문류편(答問類編)』 간행을 주도하며 노사학의 체계화와 이에 대한 계승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그는 영호남 지역의 동문과의 지속적인 교유와 강학 활동 등을 통해 노사학파 문인 간의 단합과 학문적 일체성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그는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통해 노사학파 직전 제자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하며 노사학파의 지역적 외연 확대에 기여하며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렇듯 기우만은 기정진 사후에 문인 내부에서 가장 비중이 컸으며, 학문적 영향력도 크고 지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우만의 강학 활동과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문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대체로 기우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의병 활동과 문학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노사학파 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상과 활동, 특히 노사학파 문인 가운데 가장 많은 문인의 배출로 연결된 그의 강학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사선생연원록(蘆沙先生淵源錄)』(1960)에 수록된 기우만의 직전 제자를 거주지와 성관(姓貫)에 유의하여 그의 문인 분포를 검토한 논문이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그의 강학 활동 및 배출 문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우만은 기정진 생전에 이미 기정진의 강학처를 찾았던 노사학파 동문과 학문 연찬을 진행하며 이후에 자신이 펼치게 될 강학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정진 사후에는 본격적으로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1천여 명을 상회하는 직전 제자를 배출하였다. 더구나 그의 학문적 영향력은 호남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기정진의 직전 제자 중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문인들도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지속적인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고, 기우만을 통해 이어진 노사학파 학맥은 20세기 중후반까지 이어나갔다.
이렇듯 노사학파 내부에서 가장 학문적 영향력이 컸던 기우만의 강학 활동과 이에 따라 배출된 문인들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노사학파 내에서 기우만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우만이 펼쳤던 강학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직전 제자들의 현황을 정리 분석하여 기정진 사후에 기우만이 가졌던 노사학파 내 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직전 제자들이 펼친 여러 학문 활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기우만 이후 노사학파 문인들의 노사학 계승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우만의 강학 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문인들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노사 학맥 계승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자 근현대 시기에 펼쳐진 호남 지역에서의 유교 문화 계승과 수호의 면모를 확인하는 명증한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강학 활동과 直傳 제자의 배출
독서종자(讀書種子) 양성을 위한 강학 활동의 전개
어려서부터 기정진으로부터 학문적 자질을 인정받았던 기우만은 병환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부친 기만연(奇晩衍, 1819~1876)과 두 형인 기우기(奇宇夔, 1839~1867)와 기우번(奇宇蕃, 1842~1872)의 잇따른 사망으로 인해 20대 후반부터 가문 내에서 기정진의 학문을 이어나갈 재목으로 평가받았다. 10대 후반부터 기정진을 배종(陪從)하며 착실하게 학문을 익힌 그는 30세를 전후한 시기에 당시 기호학계의 중심 학자였던 최익현(崔益鉉, 1833~1906), 임헌회(任憲晦, 1811~1876) 등과 교유하며 학자적 위상을 확인하며 향후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정진의 명에 따라 노사학파의 학문적 근거지가 된 담대헌(澹對軒) 신축을 주도하는 등 노사학파 내에서 비중 있는 문인으로 성장하였다.
1879년에 이르러 김석구(金錫龜, 1835~1885), 정재규(鄭載圭, 1843~1911), 정의림(鄭義林, 1845~1910) 등 노문삼자(蘆門三子)가 기정진으로부터 노사학의 핵심이 담긴 「납량사의(納凉私議)」, 「외필(猥筆)」을 전수받고, 이에 대해 기정진과 강론을 진행한 후 기우만을 찾아 함께 이에 대해 강론할 정도로 문인 내부에서 기우만의 위상은 상당하였다. 아울러 담대헌 준공 이후 기정진의 문하를 찾은 문인들을 대상으로 상읍례(相揖禮)를 주도할 정도로 기우만은 기정진 생전에 이미 노사학파를 이끌어 나갈 재목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우만은 기정진이 사망하자 어린 조카를 대신해 장례를 주관했고, 장례를 마친 후 곧바로 가장초고(家藏草稿)를 수습하여 문집 간행 작업에 착수하여 1883년에 첫 『노사집(蘆沙集)』을 간행하는 등 노사학파의 적전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