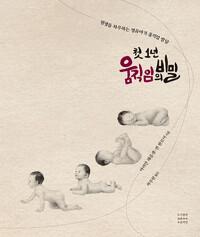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종교학
· ISBN : 9788975988134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10-12-10
책 소개
목차
발간사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장 김기현
제1부 : 수행과 종교심
불교에 있어서 진리와 수행의 세계 / 지 운
원불교 마음공부 / 이경열
도교(道敎)의 외단(外丹)과 내단(內丹) / 윤찬원
제2부 : 영성과 신비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서 베네딕도의 영적 가르침 / 허성석
퀘이커 신비주의(Quaker Mysticism)의 구조와 특성 / 김영태
이슬람의 수피즘 / 황병하
유교적 영성
― 다산 정약용의 심성론에 나타난 영명성의 문제 ― / 이향만
유대교의 신비주의 하씨디즘 / 최성식
제3부 : 종교정신과 사회
도덕 종교에서의 이성과 기독교 신앙과의 비교 / 강성률
『금강심론』에서의 ‘지상(智相)’ 해설 / 박건주
『천부경』에 내재된 기의들의 상호관계성 / 선미라
거경(居敬) 공부가 지향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 / 김기현
저자소개
책속에서
불교에 있어서 진리와 수행의 세계
지 운
전(前) 동화사 강원 강주, 현(現) 자비선 명상센타 지도법사
1. 머리말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眞理)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과정에 따르는 고(苦)를 해결해 주어서 그것을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고를 해결해 주는 진리는 깨치고자 하는 수행의 동기를 유발하며 진리에로 들어갈 수 있는 문(門) 자체가 되며 진리가 실제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진리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명백한 진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아는 진리는 영속적이지 않아서 삶의 순간순간에 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증명하여 아는 길은 수행뿐이니 수행을 통해 진리와 본래 하나임을 깨치는 지혜를 이끌어 내어야합니다. 즉 이 진리를 인식할 때 지혜가 생겨 우리의 삶과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진리란
진리가 고(苦)를 해결해주고
수행의 동기를 유발하며
진리에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며
또한 수단이 되며 길이 되어
진리는
진리 아닌 것들을 파(破)하여
진리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수행이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진리에로 돌아가며 진리 자체인 지혜가 되어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여 평안을 구현합니다.
2. 진 리
가) 진리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
세계적인 종교들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주장하는 유신론적 종교들과 창조주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은 유신론의 예입니다. 그리고 불교, 자이나교, 고대 인도의 상카파 등은 무신론의 예입니다. 무신론적 종교들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불멸하는 하나의 영혼인 아트만(atman)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와 부정하는 종교로 나뉩니다. 불교는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아를 이야기 합니다. 무아(無我)는 공(空)입니다. 특히 공은 어떤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물 안에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즉 연기법(緣起法)법의 다른 이름이 공(空)입니다.
불교에서의 진리라고 함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다는 것이며, 나란 생명은 다른 생명에 의해 존재함을 말합니다. 이 연기법의 다른 이름으로 인연, 무상·고(苦)·무아의 삼법인, 공, 중도, 법계, 여래장, 진제, 진여, 일심, 선가(禪家)에서는 한 물건, 주인공, 화두 등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특성은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인식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여(眞如)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로써 규정하는 것은 그것의 이치를 추구하거나 의미부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가에서 쓰는 단어 중에 화두(話頭)라는 용어는 말과 생각 이전의 자리를 지시할 뿐입니다. 경론(經論)에서 쓰는 진리를 규정하는 말에는 이치의 길과 말의 길이 붙을 수 있지만, 그 진리라는 말이 진리 그 자체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존재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이며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공성의 진리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진리를 화두라는 말로 바꾸어서 씁니다. 화두는 언어의 길이 끊어져 있어서 말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조사(祖師)의 언구(言句)를 참(參)하는 간화선의 방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진리의 성격과 그 두 가지 모습-불변(不變)과 수연(隨緣)
연기법경에 의하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안하거나 관계없이 법(法)의 계(界)는 상주하기 때문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설합니다. 상호의존은 곧 전체이며, 동시(同時)이며 무시무종(無始無終)입니다.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고,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며, 공간적으로는 불변의 실체나, 말이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영혼 같은 자아가 없음을 설합니다. 이는 안과 밖이 없음을 뜻합니다. 곧 걸림 없으며 상호의존하며 어떤 것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무시이래(無始以來)의 것이며 일체 모든 것이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으로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진리[眞如]의 성격에는 자아와 실체 없음의 공(空)의 모습과 인연을 따르는 불공(不空)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진리의 공의 측면인 불변(不變)을 말한다면 후자는 연을 따르는 불공의 수연(隨緣)하는 측면인데 이 둘은 하나 속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自性)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르기 때문에 몸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고뇌하는 중생이 될 수 있으며 수연이 본래 무자성의 공성임을 깨달으면 중생의 연을 따라 무한 자비심이 일어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처럼 연을 따르는 진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을 알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행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을 심으면 그에 대한 결과인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인이 제거되거나 심어진다는 것은 그 원인이 곧 무자성공(無自性空)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연기이며 깨달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는 생사고를 벗어나기 위해 깨쳐야할 인식대상이지만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궁극적인 것으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또한 연기이기 때문에 지혜의 완성은 곧 깨달은 이, 진리자체가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불교에서의 진리는 연기법이며 연기법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진리가 됩니다.)
다) 진리의 작용
진리가 고(苦)를 만날 때 고(苦)를 없애주는 힘을 가집니다. 즉 괴로움을 자각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고(苦)에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연민심을 일으키며 또한 연민심을 통해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보리심이 일어나면 보리심은 수행방법을 배우게 하고 여기서 자기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믿게 하고,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내적관찰의 수행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적관찰을 통해 선정(禪定)을 얻고 선정을 바탕으로 하여 반야지혜가 일어나며, 반야지혜가 최종에는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깨달으면 모든 고(苦)와 고(苦)의 원인이 사라져서 진리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원각경에 의하면 모든 것이 원각에서 나와서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허공에 꽃이 피고 지지만 허공은 변함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때 비로소 깨닫고 보니 깨달을 것이 본래 없어 무각(無覺)이며 닦고 보니 닦을 것이 없어 무수(無修)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잠스님은 법성게(法性偈)의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을 주석하여 이르시기를,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잠이 들어 꿈속에서 30여 여관(旅館)을 전전하다가 꿈에서 깬 후에야 비로소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雪岑撰, p.23.) 그러나 진리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마명보살이 설하기를, “지혜가 번뇌를 없애고 난 뒤 밖으로 중생을 향하여 자비심을 일으켜 구제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중생을 향해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해 갑니다. 이 모두가 진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 고(苦)의 발생과 자각으로부터 작용하는 진리의 모습은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궁자(窮子)의 비유’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괴로움을 자각하고 보리심을 일으킴과 지혜와 자비심, 그리고 깨달음마저도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는 연기(緣起)이기 때문이며 연기는 인연이며 인연은 공이며 공의 뜻은 깨달음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연기로서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라) 진리가 문이 되고 수단이 되며 길이 됩니다
진리가 문(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현상적으로는 인연생멸(因緣生滅)하는 모습이 있고 본질적으로는 무생멸(無生滅)하는 공(空)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생멸하는 모습은 곧 인과 연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인연생멸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인연생멸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생멸의 모습은 깨쳐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됩니다. 이를 대승기신론에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 무생멸은 또 하나의 깨쳐들어 가는 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생멸은 마음의 생멸이며 여기에는 자아와 실체가 없습니다. 자아와 실체 없음의 세계는 말 그대로 마음의 무생멸입니다. 따라서 관찰하는 마음을 무생멸 상태로 만들면 마음 진리의 무생멸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 진리의 무생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 모습도 하나의 깨침의 문이 됩니다. 이를 대승기신론에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라 합니다.
문이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사마타의 선정과 위빠사나의 지혜로서만이 들어올 수 있으며 궁극에는 진리를 깨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지혜가 자비의 모습으로 바뀌어 중생의 번뇌망상을 없애주는 구제하는 활동으로 뀝니다.
진리가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연기이며 연기는 주객이 상대하여 일어나는 앎이며 앎은 곧 마음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바르게 아는 수단도 진리의 작용입니다. 즉 이 마음의 본성이 공인데 공하지 않는 번뇌가 일어나면 이 공인 마음이 공하지 않는 번뇌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발보리심이며 욕·승해·염·정·혜의 수행심리가 나타납니다.
특히 수행심리 가운데 념(念)의 집중에 의해 생각의 흐름이 그쳐지는 사마타(止)수행과 념(念)을 의지해 사유하여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는 위빠사나(觀)의 수행법이라는 수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타에 의해 앎이 고요하면 선정이며 위빠사나에 의해 이 앎이 법을 아는 것이라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바로 진리를 아는 앎이자 연기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연생멸의 문은 위빠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며 본질적인 공(空)의 문은 사마타 수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라는 수단에 의해 인연생멸의 문(門)과 공(空)의 문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치지만 이 수단이 곧 진리의 작용이므로 진리라는 근원에서 나와서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것은 곧 진리의 속성을 말합니다.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수단에 의해 진리인 인연생멸의 문과 공의 문으로 들어가고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팔정도, 육바라밀,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이 모두 삼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회복이며 진리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몸과 마음의 무상을 관찰하면 ‘항상하다’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 의해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등의 번뇌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길[道]을 내는 것입니다.(‘봄’이라는 의미를 지닌 바른 견해[正見]의 길이 생김을 말합니다. 또한 마음 쏟음의 의미를 지닌 바른 사유[正思惟], 받아들임의 의미를 지닌 바른 말[正語], 일어남의 의미를 지닌 바른 행위[正業], 청정의 의미를 지닌 바른 삶[正命], 정근의 의미를 지닌 바른 정진[正精進], 확립의 의미를 지닌 바른 마음 지킴[正念], 산란하지 않음의 의미를 지닌 바른 삼매[正定]의 길이 생김을 말합니다. 즉 팔정도八正道의 길이 생김을 말합니다.) 이 길을 익히고 닦으면 생각과 생각의 얽히고 설킨 것을 끊을 수 있으므로 느낌과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성향까지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계와 선정, 그리고 지혜가 일어납니다. 모든 수행이 계(戒)·정(定)·혜(慧) 삼학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타는 선정을, 위빠사나는 지혜를 계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율은 선정과 지혜가 일어나도록 하는 바탕입니다.
3. 수행의 세계
가) 수행동기-발보리심
왜 진리를 찾을까요? 괴로움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번뇌로부터 생기며 번뇌는 자아로부터, 자아는 진리가 본래 하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름을 무명(無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습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인 줄 모르는 무명, 즉 무지(無知)를 없애는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인생을 ‘고(苦)’라고 말하면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행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행복하다고 할 때는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행복해 할 수도 있지만 그 행복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행복은 나 하나만의 행복으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서 존재함으로 독립된 개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행복이란 일시적이며,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으니, 모든 존재는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행복한 삶을 가꿔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중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들었으며 중생의 병이 모두 나으면 나의 병도 낫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괴로움의 해결을 물질적인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허상으로 인하여 삶의 허무함 또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의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되물음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 각종 종교 수련회 및 신행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수행을 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과 생각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 곧 일시적이지 않은 행복이 삶 그 자체가 되어 생로병사의 고(苦)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수행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때 만일 삶과 죽음의 괴로움이 없다면 굳이 진리를 찾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최초의 법문에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려줄 따름이니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니라.”(중부경 22)입니다.




































![[큰글씨책] 태평경 천줄읽기](/img_thumb2/9791130458823.jpg)

![[큰글자] 한비자, 바른 법치의 시작](/img_thumb2/97889522279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