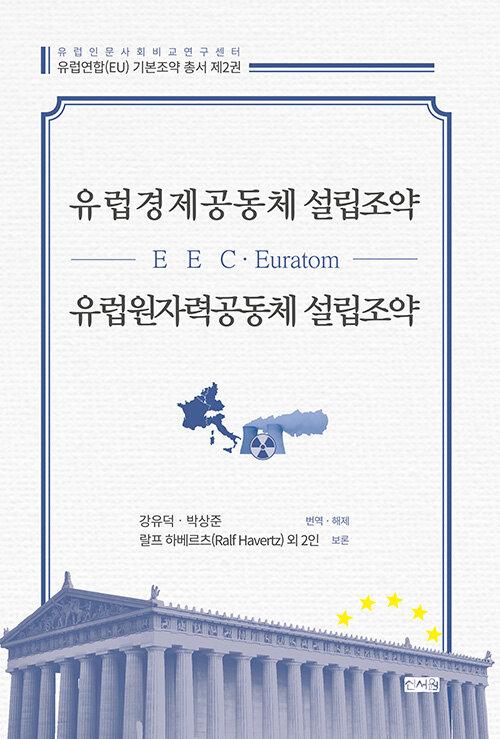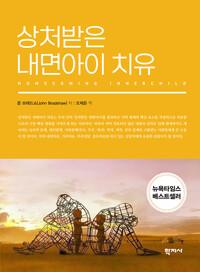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91171992447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4-06-28
책 소개
목차
서문 5
제1장 신사회계약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새로운 계약인가, 새로운 서사인가 21
제2장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신사회계약론’과 유럽 사회에 주는 함의 51
제3장 한나 아렌트와 ‘포스트 베스트팔렌’ 세계를 위한 사회 (간) 계약 89
제4장 자연 개념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역사적·현상학적 사유 127
제5장 탄소인간에서 퇴비인간으로의 생태적 전환: 해러웨이 인구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169
제6장 미노슈 샤피크의 신(新)사회계약론 탐구: 내용 분석과 유럽그린딜 197
제7장 유럽그린딜, 유럽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231
제8장 두 번의 이중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지구화의 기원 · 발전 · 위기 · 전환 271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1장 ‘신사회계약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새로운 계약인가, 새로운 서사인가’의 맺음말 中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사회계약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계약론적 전통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실제로 어떤 사회 계약이 과거에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체결되었고 끊임없이 그 사회계약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갱신되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제시되었고, 이후 반복해서 과거의 사회계약(에 관한 주장)에 근거해 새로운 설득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는 뜻이다.
16~17세기에 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하고, 종교적 권위가 약해지고, 상업적 관계가 확장되고, 그리하여 기존의 정치 질서가 더는 과거의 서사를 통해, 즉 왕권신수설이나 가부장지배론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몇몇 창의적 사상가들이 ‘사회계약’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통해 기존의 정치 질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화하기도 했고, 아예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과거의 논의들에 근거해 오늘날 계속해서 사람들은, 특히 그 논의들이 생겨난 서유럽, 즉 영국, 프랑스 등지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촉구하고 정당화한다.
사회계약의 체결을 일종의 법적 행위로 보는 사람은 사회계약의 구속력이 법의 근거가 되는 사회계약 그 자체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법이 근거해 마땅한 어떤 도덕률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회계약의 체결을 일종의 거래 행위로 보는 사람은 사회계약의 구속력이 상호 이익에 달려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회계약의 체결을 일종의 서사적 구성이라고 보면, 사회계약의 구속력은 결국 이야기의 설득력에 달려 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 각자를 사회계약의 당사자로 여기게 만들고, 그 계약에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이건, 계약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건,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건 간에, 어쨌거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사회계약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서사)로 파악할 때, 우리는 ‘사회계약론’을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등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러므로 또한 ‘사회계약’을 인간의 정치적 삶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약속 가운데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 유럽 밖의 다른 전통에서도, 예컨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약속들’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을 유연하게 변형하여 유럽 밖의 다른 전통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인 사회의 실제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느냐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치적 힘은, 마치 유대 왕국에서 ‘언약’을 상기시키며 나타나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정치적 힘이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생생한 해석 능력에 달려 있었듯이, 결국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해석적 능력에 달려 있다.

































![어두운 시대의 한나 아렌트 : [열다섯 저작 속의] 소통윤리와 수사학](/img_thumb2/9788979406580.jpg)





![[세트] 지성교정론 + 정치론 - 전2권](/img_thumb2/K36263862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