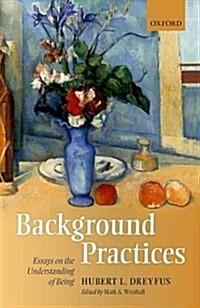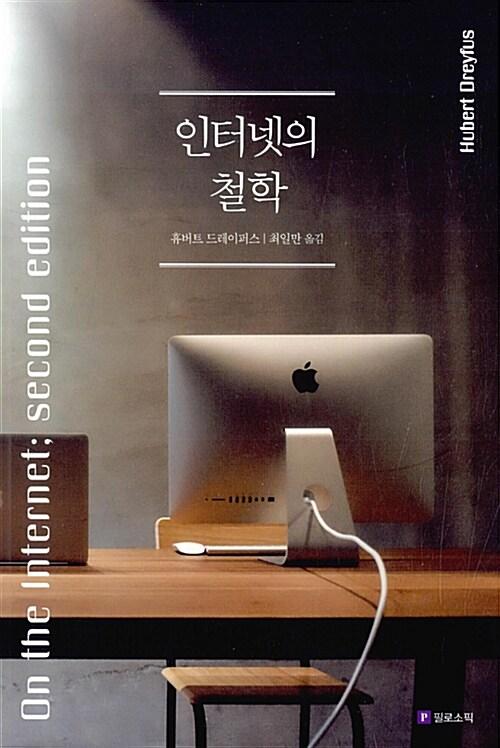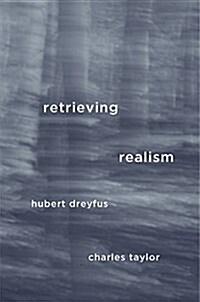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현대철학 > 현대철학 일반
· ISBN : 9791192986425
· 쪽수 : 341쪽
· 출판일 : 2025-07-22
책 소개
목차
서문 _ 9
1장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하나의 그림 _ 11
2장 그림에서 탈출하기 _ 61
3장 믿음의 확인 _ 113
4장 접촉 이론: 선개념적인 것의 자리 _ 143
5장 몸속에 깃들인 이해 _ 181
6장 지평 융합 _ 201
7장 되찾은 실재론 _ 257
8장 다원적 실재론 _ 289
찾아보기 _ 329
옮긴이의 말 _ 335
책속에서
- “하나의 그림이 우리를 가두어 놓았다.” 이 문장은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의 115항에서 말한 것이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데카르트에서 시작하는 소위 근대 인식론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깃들어 있고 또 그것을 받쳐주는 세계-내-정신이라는 영향력 있는 그림이다. 비트겐슈타인이 ‘그림’이라는 말을 써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은, 하나의 이론과는 다른 그리고 이론보다 더 깊은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분야를 위한 맥락을 제공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이론화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로 반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배경 이해이다. 이 주장은 데카르트에서 유래한 주류 인식론적 사고가 전혀 명시적이지 않은 이 그림에 담겨 있었고, 따라서 그 그림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것은 일종의 감금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이 사고의 전체 노선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상자 밖에서’ 생각할 수 없다. 그 그림이 너무나 명백하고, 상식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그림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의 큰 실수를 파악하는 일, 즉 우리의 이해를 왜곡하고 동시에 이 왜곡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틀 오류와 같은 것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이다.”
(1장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하나의 그림’)
- “누가 옳을까?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서 실제로 탈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명백한 사고는 우리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암묵적이고 대체로 명료화되지 않은 배경 의미에 의해 맥락화되어 있고 그 의미를 얻는다. 우리는 좋든 싫든,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면서 항상 살아간다.
그 때문에 매개적 그림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이론적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놔두고 떠나가 버리는 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로티가 이러한 문제들을 기각함으로써 우리가 완벽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것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배우고, 세계를 기술하고,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관행을 이해하는 선이해를 명료화하기 때문이다.”
(3장 ‘믿음의 확인’)
- “우리는 이해를 수반하는 환경과 선개념적으로 관여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유도하는 개념적 믿음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공간에서의 교류는 중립적인 요소들 간의 인과적 작용이 아니라 적절한 것을 감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외부 경계를 가진 내부 구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행위 주체의 ‘정신 속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호 작용 자체에 있다. 내가 길을 오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알 수 있도록 하는 이해와 실천적 지식은 일종의 묘사에서 볼 때 내 ‘정신 속에’ 있지 않다. 그 이해의 운명은 때를, 즉 내가 지도를 그리는 단계를 밟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해는 내가 길과 협상하는 데 있다. 이해는 상호 작용에 있다. 이해는 관련 환경이 없을 때 이 상호 작용 밖에서 도출될 수 없다. 이해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를 명백한 지식, 개념적 지식, 언어 기반 또는 지도 기반 지식의 모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인데, 이는 물론 데카르트에서부터 로크를 거쳐 현대 인공 지능 모델 제작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I/O 전통이 하려고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경계를 재창조하는 움직임, 그리고 지각적 지식의 작용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움직임인 것이다.”
(4장 ‘접촉 이론: 선개념적인 것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