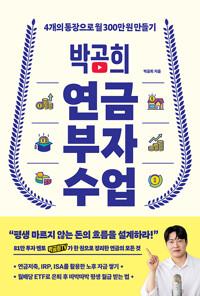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아시아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91196255190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19-06-27
책 소개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 5
머리말 9
제1장 하늘에서 돈을 뿌리면 경기가 좋아지는가 25
아베노믹스의 뿌리에는 거시경제학이 있다 27
성장정책은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이 아니다 30
그렇다면 재정정책? 아니면 금융정책? 38
베이비시터 조합의 위기 40
헬리콥터 머니 47
존 로우의 연금술 50
제2장 정부지폐와 재정 파이낸스 59
역사 속 정부지폐 61
은행권의 기원 65
제로 금리와 정부지폐론 69
재정 파이낸스는 이미 하고 있다 78
신용창조 83
무(無)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민간은행 86
플러스 금리 경제의 제약 91
제로 금리 경제의 제약 94
무능한 친구 둘을 합쳐도 무능하다 96
나라의 빚은 제로가 된다? 99
중앙은행이 가진 국채는 영구채로 해야 하나? 102
직접적 재정 파이낸스 108
제3장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과 헬리콥터 머니 111
장기적인 수요부족의 가능성 114
자연실업률 가설 118
피구 효과 127
화폐의 장기적 중립성 130
화폐의 장기적 비(非)중립성 137
화폐성장과 기술적 실업 142
기술적 실업의 장기화 144
장기적 수요부족의 해결 148
굴곡진 장기 필립스 곡선 150
20년을 잃어버렸던 진짜 이유 154
제4장 일본 경제는 어떤 함정에 빠졌는가 157
폴 크루그먼의 유동성 함정 모델 163
제스 벤하비브 등의 디플레이션 함정 모델 167
신용창조 함정 173
제5장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 185
화폐발행이익 187
화폐발행이익=기본소득 190
국민 중심 화폐 제도 198
100% 지급준비제도 203
인공지능과 두 가지 기본소득 207
부록
역자의 말 217
이론모델 231
주석 237
참고문헌 240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내가 주목하는 ‘경기’는 경제학자들이 ‘단기’라고 부르는 척도의 시간보다 길다. 단기는 4~5년을 주기로 숨가쁘게 일어나는 순환이다. 내가 주목하는 경기는 20~30년, 때에 따라서는 100년 정도의 시간처럼 문화와 문명의 특징을 결정짓기에 충분히 긴 기간 동안 나타나는 호황이나 불황이다. 이런 정도의 호황과 불황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러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바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다.
돈의 양이 충분히 많으면 호황이 오고, 적으면 불황이 온다. 이런 내 의견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반론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장기적으로도 돈의 양이 경기를 좌우하고, 문화와 문명의 질도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매우 부족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이 늘어나는 비율이 너무 낮았다. 숫자로 보자면 거품경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7~13%였는데, 붕괴 이후 지금까지도 2% 안팎이었다. 비록 안정적이기는 했지만 아주 낮은 상태다. 안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뉘앙스는 긍정적이지만, 사실 거칠게 말하자면 ‘계속 땅바닥을 기어가는 모양새’다. 돈의 부족이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곡소리가 날 정도로 괴롭힌 디플레이션 불황의 원인이다.
묘한 매력을 가진 헬리콥터 머니의 개념은, 밀턴 프리드먼의 논문에서 시작한다. 1969년 밀턴 프리드먼은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면 어떨까?’라는 사고 실험을 한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2년에 (나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되는) 벤 버냉키가 “통화창조를 재원으로 하는 감세는 밀턴 프리드먼의 유명한 ‘헬리콥터 머니’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라고 강연에서 말했다. 즉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과 감세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은, 헬리콥터 머니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었다. 이 결합에 대해서는 재정 파이낸스를 다루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어쨌건 이 발언 이후, 버냉키에게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야유 섞인 별명이 생겼다. 당시 금융정책을 열심히 공부하며 이런 저런 생각으로 밤을 새고는 했던 나로써는, 비아냥거리는 풍조에 커다란 위화감과 약간의 분노를 느꼈다. 버냉키는 매우 정직하게도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이를 비웃는 자들이 공부가 부족하거나, 생각이 모자라거나, 공부도 생각도 빈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도 헬리콥터 머니는 거의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저 불량스러운 정책으로 여겨지고 계속 놀림감이 되었다. 발언을 했던 버냉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취임한 후,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 묻혀 있던 은을 거의 다 캐내버린 17세기가 되자, 다시 화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 공교롭게도 기후가 다시 한랭해지면서 농업에서 불황이 시작되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정체되었다. 이는 사회가 불안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유럽이 맞은 ‘17세기의 위기’다.
화폐의 부족에서 비롯한 위기는 화폐를 채우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8세기 들어 브라질에서 금광을 새로 찾는 등, 기존 화폐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폐와 예금화폐와 같은 신용화폐가 화폐 부족 문제를 푸는 해결사로 나서면서부터 유럽은 위기에서 벗어난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17세기 중국은 청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다. 청나라의 네 번째 황제였던 강희제(康熙帝)는 40년 정도 해금정책(海禁政策), 즉 쇄국정책을 실시했다. 원래 유럽 사람들은 중국의 도자기나 차 같은 상품을 사가면서 은을 냈다. 은이 계속 들어오니 중국에서 은을 화폐로 쓰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쇄국정책을 펴 중국 물건을 유럽 사람들이 사기 어렵게 되자, 중국으로 들어오던 은의 양도 줄어들었다. 이것이‘곡천(穀賤)’이라 부르는 디플레이션 불황이었다.
17세기 말, 강희제의 해금정책이 풀리고 은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화폐 부족 문제도 풀리기 시작했다. 이제 은, 즉 화폐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도 일어났다.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늘었다. 중국 인구가 수억 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 때가 바로 이 시기부터다.
여러 역사적인 사례들은 화폐의 뚜렷한 증가가 장기적 호황과 경제성장의 한 요인이 되며, 인구가 늘어나는 데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와 동료 학자들은 낮은 화폐성장이 산출 격차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메커니즘도 찾았다. 더불어 최근에는 화폐가 장기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이고 전문적인 경제학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