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에세이 > 자연에세이
· ISBN : 9788990832030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04-08-10
책 소개
목차
오늘 못한 일을 내일 하면 되지 - 허병섭
노동을 하는 내내, 눈에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이 들어온다. 향기로운 꽃냄새가 항상 주변에 있다. 나비와 별, 곤충과 갖가지 새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내는 음악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일한다. 덥고 힘들면 바로 옆에 있는 개울을 찾아 발을 담그고 주변의 열매를 따먹으며 쉬기도 한다. 맑고 상쾌한 공기가 코와 폐부 깊숙이 들고난다. 땅 위와 땅 속의 벌레들과 미생물을 만나 대화하고 교감하며 생명의 신비를 느낀다.
생명누리의 꿈 - 정호진
도시의 삶을 뒤로 하고 농촌에서의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구 년째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 부모 직업란에도 당당히 농부로 올라 있고, 농부인 아빠에 관한 이야기도 아이들 일기에 자주 등장한다. 어떤 농부와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농사짓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생겼다. 참으로 좋은 길을 선택했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다. 무엇보다도, 농사일이 때때로 힘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이 정말 즐겁다. 때론 벌들을 보면서 무아의 경지에 빠지기도 하고,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황혼녘에 방물땀 씻어내며 일손 멈추고 맨발로 대지에 서서 하늘과 땅과 내가 모두 하나된 황홀한 경험도 한다.
아침은 아침같고, 밤은 밤같은 촌에서 살아요 - 오한숙희
아침에 마당에 나가서 딸아이의 머리를 빗길 때면 새들의 합창이 대단하다. "엄마, 새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 빗는 애는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그 전에는 텔레비전에 눈이 가는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겨 중심을 잡느라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거의 시적인 대화를 나누는 우아한 모녀가 된 것이다.
올봄의 농촌소식 - 권정생
쪼바리, 벌구두데기, 나랑나물, 꼬질개, 장깨나물, 가지북다리, 미역나물, 바디나물, 참뚝가리, 개뚝가리 같은 봄나물 이름도 우리 산골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이름 붙여서 불러온 말들이다. 소박한 산골 어머니들의 생활 감정이 하나하나 깃들어 있어, 그야말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시인 것이다. 이른 봄부터 삭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추운 겨울엔 열매를 거두어들여 따뜻한 방 안에서 옛날 얘기를 하며 살아가는 농촌은 시를 만들고 시처럼 살고 있는 곳이다.
일노래꾼의 첫농사이야기 - 편해문
저는 일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일노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실적 기능이 이미 없어져버린 일노래를 오늘에 되살려 일터에서 다시 불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에 와서 합치려는 것은 무리이고 억지입닏. 그렇다고 서둘러 무대에 기어올라가려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무대는 반성과 책임과 건강함을 찾기 어려운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라져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놔두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풋내기 농사꾼의 이야기 - 양희규
자연을 사랑하고 도시문화를 지독히 싫어하며 이 사회 전체가 농촌 지향적인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흐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향적인 문화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고도의 산업사회가 오며 찬란한 컴퓨터 문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리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즐거움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가 주는 기쁨 없이는 도무지 살 재미를 가질 수 없다.
여자가 움직이는 농촌 - 윤정모
"솔지 엄마!" 그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날 부른다. "이 집은 깻대도 안 보이는겨? 다 자빠졌어! 그런 건 얼릉얼릉 벼서 말려야 하는겨." 그래 놓고 내가 나가기도 전에 횡하니 가버린다. 사실 나는 나일론 건달 농사꾼이다. 녹두나 콩이 다 여물어 알이 쏟아지고 있어도 거둬들일 줄 모르는 내가 딱했던지 아낙들은 짚앞을 지나다니며 풀 베줘라, 고구마 옮겨 심어라, 감자 지금 안 캐면 싹이 난다, 콩잎 때깔이 좋지 않다, 비료 좀 줘라 하고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들을 설득시키겠다던 내가 오히려 걸음마부터 배우는 형편이다.
아무 일 안 하고 잘 산다 - 이현주
왜 시골로 갔느냐. 가서 농사를 짓느냐. 뭘 해서 먹고 사느냐. 도대체 거기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서울 사람들 툭하면 다 그만두고 시골로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해줄 말은 없느냐. 대충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사한 지 겨우 일 년 남짓한 처지에 과연 '살았다'고 할만한 게 있을 것도 없고 이게 여기서 하는 내 일이라고 소개할 만한 것도 없지만 시골로 온 것만은 사실이니 있는 대로 형편대로 질문에 대답해 보겠다.
시골신부의 집짓는 이야기 - 정호경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늙기 전에 노동을 할 건강이 있을 때,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죽겠다.' 행복한 인생이란 '시명을 바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란 짜인 틀 속에서 성당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복지에 토신할 수도 ㅣㅆ고,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 또는 농민과 함께 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입품'만 팔다가 가는 삶이 두려웠고,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흙에서 '즐겁게 땀흘려 일하다 가는 삶'이 그리웠습니다.
고향, 근원자리로 돌아가기 - 이병철
아니다. 농촌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은 낭만이다. 낭만이 없는 삶에 무슨 보람과 신명이 있는가. 이제 거짓된 삶, 꼭두각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벌이 때문에 또는 무슨 거창한 이념과 주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고 눈치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날의 삶에서 건강과 즐거움과 작은 기쁨 그 자체에 충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볍고 즐겁게 시작하는 삶이어야 한다. 풀벌레와 어울려, 메뚜기와 지렁이와 함께 농사짓고 매 끼니 텃밭에서 갓 캐온 남새로 밥상을 차리며 아이들과 냇가에서 버들치, 피라미 잡으며 살고자 하는 그 소박한 꿈을 이루는 일이 어찌 낭만 없이 가능할 수 있으랴.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무엇보다 자연을 실감나게 하는 것은 고추, 깻잎, 호박같이 손에 잡히고 입에 들어오는 것들이다. 여자만 사는 우리집에 고추가 열렸을 때 어찌나 재미있던지. 희록이는 고추 따오기를 좋아했다. 사촌 남동생들 이름으로 고추의 크기를 말하며 따고 싶어 안달이다. 돼지 삼겹살을 구워먹는 날이면 저마다 먹을 만큼 깻잎을 따온다. 깻잎은 신기하게도 심지 않았는데도 담장 밑이나 마당 한켠에 무성했다. 시장에 갔다가 깻잎을 묶어 파는 것을 본 언니가 무심결에 "요새도 깻잎 사먹는 사람 있나"해서 우리를 웃겼다. - 본문 69쪽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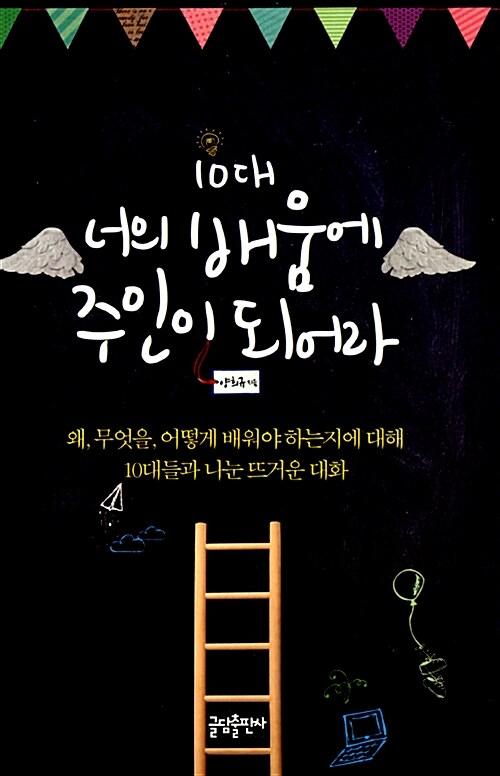


![[큰글자도서] 사는 게 참 좋다](/img_thumb2/9791190275422.jpg)




![[큰글자도서] 그곳에 엄마가 있었어](/img_thumb2/97911306460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