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문화/문화이론 > 한국학/한국문화 > 한국인과 한국문화
· ISBN : 9788937415784
· 쪽수 : 4750쪽
· 출판일 : 2017-11-24
책 소개
목차
1 우렛소리 ─ 이규보 외 | 이종묵·장유승 편역
2 오래된 개울 ─ 권근 외 | 이종묵·장유승 편역
3 위험한 백성 ─ 조식 외 | 이종묵·장유승 편역
4 맺은 자가 풀어라 ─ 유몽인 외 | 정민·이홍식 편역
5 보지 못한 폭포 ─ 김창협 외 | 정민·이홍식 편역
6 말 없음에 대하여 ─ 이천보 외 | 정민·이홍식 편역
7 코끼리 보고서 ─ 박지원 외 | 안대회·이현일 편역
8 책과 자연 ─ 서유구 외 | 안대회·이현일 편역
9 신선들의 도서관 ─ 홍길주 외 | 안대회·이현일 편역
별권 근대의 피 끓는 명문 ─ 서재필 외 | 안대회·이현일·이종묵·장유승·정민·이홍식 편역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레가 칠 때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뇌동(雷同)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우렛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잘못한 일을 거듭 반성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기에 그제야 몸을 펴게 되었다. …… 또 한 가지 인지상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비방하면 안색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레가 칠 때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 어두운 방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우렛소리(雷說)」
“말은 입에서 나와 문장을 이룬다. 중국 사람의 학문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나아가므로 정신을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자면 언어에 이미 중국과 오랑캐의 차이가 있고, 타고난 자질도 영민하지 않으니 백배 천배 힘쓰지 않으면 어찌 학문을 이루겠는가? 그래도 오묘한 마음에 힘입어 천지 사방과 소통하는 데는 터럭만큼의 작은 차이도 없다. 득의한 작품으로 말하자면 어찌 자세를 낮추며 저들에게 많이 양보할 것이 있겠는가.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점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 최해 「우리 동방의 문학(東人文序)」, 1권 『우렛소리』 중에서
우리 동방의 문장은 한과 당의 문장도 아니고 송과 원의 문장도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문장이다. 당연히 역대의 문장과 더불어 천지 사이에 나란히 알려져야 할 것이니, 인멸되어 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도에 마음을 두고 문장을 꾸미지 않으며, 경전을 근본으로 삼고 제자백가를 기웃거리지 않으며, 올바른 문장을 숭상하고 화려한 문장을 배척하여 고상하고 올바른 문장을 짓는다면 필시 성현의 경전을 보충하는 글이 될 방도가 있을 것이다.
─ 서거정 「우리 동방의 문장(東文選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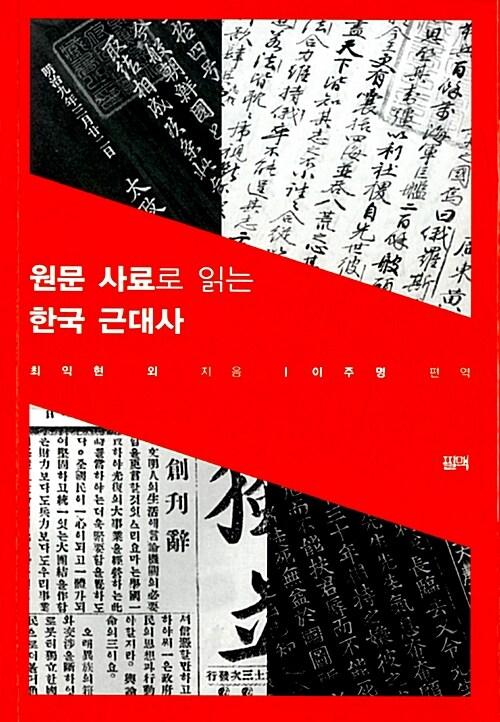




















![[큰글씨책] 진사왕 조식 시선](/img_thumb2/9791128820137.jpg)
































![[세트] 동물 생각 + 팔도 유람기 (워터프루프북) - 전2권](/img_thumb2/K822733544.jpg)









![[세트] 박사 문어, 시간을 거슬러 도착한 말들 +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느린 과학 선언 - 전2권](/img_thumb2/K662136571.jpg)